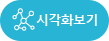| 항목 ID | GC00701765 |
|---|---|
| 한자 | 接尾辭 |
| 영어음역 | Jeommisa |
| 영어의미역 | suffix |
| 분야 | 구비 전승·언어·문학/언어 |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 집필자 | 김미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쓰이는 말 중에서 낱말의 끝에 붙어 의미를 첨가하여 다른 낱말을 이루는 접사(接辭).
새 말을 만들어 내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어근에 어근을 붙여 합성어를 만들거나 어근에 접사를 붙여서 파생어를 만드는 것이다. 접사는 결합하는 위치에 따라 어근의 앞에 붙는 접두사와 어기의 뒤에 붙는 접미사로 나눌 수 있다.
접두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지배적 기능은 없고 어근의 의미를 한정하는 한정적 기능만을 띠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접미사는 품사를 바꾸는 지배적 기능과 의미를 한정하는 한정적 기능 두 가지를 가질 수 있다.
일반적인 한국어의 접미사는 체언, 용언에 두루 결합하는데 체언에 붙는 접미사로는 존칭을 나타내는 ‘-님’이나 동작주(動作主)를 나타내는 ‘-수’ ‘-자’ 등, 복수를 표시하는 ‘-들’, 그 밖에 ‘-화’ ‘-식’ ‘-적’ 등이 있다. 용언에 붙는 접미사로는 사동·피동을 나타내는 ‘이·히·리·기·우’ 등을 들 수 있다.
또 접미사 가운데는 원래의 품사는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의미만을 첨가하는 것, 원래의 자립어와는 문법적 기능을 달리하는 것이 있으며, 형용사에서 명사를 파생시키는 경우, 또는 명사에서 동사를 파생시키는 경우 등도 있다. 그리고 접미사와 어미의 구별이 모호한 경우도 많다.
제주도 방언의 접미사는 고어의 잔영으로 볼 수 있는 어휘가 많고, 방언적인 형태가 많다. 표준어와 같은 형태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지만 표준어의 접미사와 목록을 비교할 때 많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표준어가 파생어를 가지고 있으나, 방언에서는 파생어가 없을 수도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1. 사동과 피동 접미사의 형태가 다양하고 많다는 특징이 있다. 제주방언의 사동 접미사 가운데 특이한 것은 ‘-지-’이다. 이것은 표준어의 ‘-이-’나 ‘-기-’에 대응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눅지다(눕히다)·붙지다(붙히다)·입지다(입히다)·업지다(업히다)·지다(감기다)·빗지다(빗기다) 등이다.
사동 접미사가 이미 결합된 형태에 다시 접미사 ‘-우-’가 결합된 어형이 쓰이는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얼리우다(얼리다)·리우다(마르게 하다)·걸리우다(걷게하다)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도 돋후다(돋구다)·굳후다(굳히다) 처럼 ‘-히-’ 대신에 ‘-후-’가 쓰인 예가 보인다. 피동 접미사는 표준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밟-’의 피동형이 ‘리-’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2. 표준어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도왜다(도와주다)’, ‘덜애다(덜어주다)’의 형태가 있다. 이것은 수여의 뜻을 가진다. 그러나 분포는 그리 넓은 편은 아니다. 그리고 변이 형태라고 할 만한 ‘도오(돕-)-앰--, 덜-앰--’가있다.
이런 형태는 표준어에서는 단일어로 대응되는 형태를 찾을 수가 없다. 또한 ‘-애-’는 ‘을 덜애다(잠을 자지 못했다)’ 처럼 ‘수여’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동과 사동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3. 다양한 형태의 강세 접미사를 가지고 있다. ‘-ㄱ-, -(으)대기-, -뜨-, -수-,-싸/쌔-, 쓰, -아리-, -웁-, -치-’ 따위의 접미사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직다(만지다), 거두대기다(거두다), 누르뜨다(누르다), 깨수다(깨뜨리다), 베르싸다(헤치다), 세아리다(헤아리다), 걷웁다(거두다), 거리치다(눕히다) 등이 있다.
1. 파생 과정에 받침으로 쓰인 /ㄹ/이 탈락하는 현상이 표준어의 규칙과 다른 점이 있다. 표준어 파생어에서는 /ㄹ/받침이 탈락하는 형태들이 방언에서는 탈락하지 않는 것들이 더러 있다.
방언에서도 /ㄹ/받침이 ‘ㅅ·ㄴ·ㅂ·ㅈ’ 앞에서 수의적으로 탈락하기는 하지만 표준어의 규칙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을내낭(가으내)·저슬내낭(겨우내)·하늘님(하느님)·아님(아드님)·님(따님)·이(다달이) 등이다.
2. ‘-ㅇ’이 덧난 통합이 많다. 중이, ‘송애기(송아지)·생이(망아지)·버렝이(벌레)·주넹이(지네)’ 등 의 파생어는 형태 분석에서 어려움을 주기는 하나 방언에서 표준어보다 더 비음성의 자질을 가진 소리의 사용이 다양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3. /ㅎ/이 형태소 경계에 개입되는 것이 특징이다. ‘ㅎ’이 덧나는 것을 ㅎ 곡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지들커(땔감)·비차락(빗자루)·조팥(조밭)·뒤칩(뒷집) 등이다.
4. ‘-방’은 남성 파생 접미사로, ‘-망’은 여성 파생 접미사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아지방(아저씨)·하르방(할아버지)·아지망(아주머니)·할망(할머니) 등이다. ‘-을락/-을내기’ 등의 접미사는 분포에 거의 제약이 없이 동사와 결합하여 ‘경기’ 또는 ‘내기’의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면, 을락/을내기(달리기)·먹을락/먹을내기(내기)·곱을락/곱을내기(숨바꼭질) 등이다.
1. 명사 파생 접미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거리, -걸리, -치기, -데기, -싸리, -이/-ㅇ 이/-엉이/-앙이, -청/-나청, -퉁이, 바치/왓치/ -바시, -장이/ -쟁이/-젱이, -지기, -잽이, -님. -군, -셍이, -아리/-어리, -아지/-어지/-야지/-마지/ -암지, -바듸/ -바데, -따시, -으랭이, 뗑이, -치, 옵, -엉/-앙, -태기, -멍/-망, 방, -씰, -다리, -방맹이, -망둥이, -찡, -게/개, -애, -기, -(으)ㅁ, -배기, -을락/-을내기, -우리, -에, -다리 등
2. 동사 파생 접미사로는 -오-/-우-, -호-/-후-, -수-, -이-, -지-, -기-, -이우-, -뜨-, -치-, -히-, -리-, -아지-/-어지-, -추-, --, -지- 등이 있다. 형용사 파생 접미사는 -압-, -엉-/-앙-, -이롱-/-으롱-, -- 등이 있다. 부사 파생 접미사는 -이/-기, -억/-악/-락, -영,-신,-직,-잇,-곰, -딱 등이 있다.
- 이기갑, 『국어 방언 문법』(태학사, 2003)
- 송상조, 「제주도 방언의 접미 파생어 연구」(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 부희숙, 「제주 서사무가에 나타난 어휘 형성 연구」(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