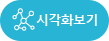| 항목 ID | GC00711318 |
|---|---|
| 영어음역 | Jinsadae Sori |
| 영어의미역 | Jinsadae Song |
| 이칭/별칭 | 긴사대 소리 |
| 분야 | 구비 전승·언어·문학/구비 전승,문화·교육/문화·예술,문화유산/무형 유산 |
| 유형 | 작품/민요와 무가 |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
| 집필자 | 조영배 |
| 문화재 지정 일시 | 2005년 10월 5일 |
|---|---|
| 문화재 지정 일시 | 2021년 11월 19일 - 진사대소리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재지정 |
| 성격 | 민요|노동요|농업요|부요 |
| 토리 | 도선법 |
| 출현음 | 도레미솔라 |
| 기능구분 | 노동요 |
| 형식구분 | 가[A+B]+나[C+D]+D |
| 박자구조 | 자유 리듬 |
| 가창자/시연자 | 강옥심[애월읍 금덕리]|변문숙[애월읍 납읍리]|진선자[도지정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
| 문화재 지정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에서 부르는 ‘김매는 소리’의 하나.
진사대소리는 「긴사대 소리」라고도 부르는데, 「자진사대소리」와 「김매는 아외기 소리」·「김매는 홍애기 소리」 등과 함께 주로 여성들이 김을 맬 때 부르는 노동요이다. 농사의 종류에 따라 김매는 시기도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김매는 작업은 조와 콩·고구마 등 여름 농사와 관련하여 김을 매는 경우와, 보리 등의 겨울 농사와 관련하여 김을 매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때 부르는 민요를 총칭하여 김매는 소리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진사대소리는 구(舊)북제주군 애월읍 지역에서 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보통 「자진사대 소리」를 부르다가 진사대소리를 부른다.
MBC의 「한국민요대전」(제주도편)과 조영배 등이 채록한 「아름다운 전통의 소리」 등에 수록되어 있다.
종지음은 도이고, 구성음은 도레미솔라로 되어 있다. 자유 리듬에 특정한 장단은 없으며, 악곡 형식은 한 사람이 선소리를 부르면 여러 사람들이 후렴을 받는 형태([A+B]+나[C+D]+D)로 부른다. 주로 청성을 사용하며, 세요성이 매우 특징적으로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민요이다.
진사대소리는 긴 호흡으로 부르기 때문에 가사 처리가 매우 멜리스마틱하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설을 엮어 나가기보다는 “어허어이야 엉어허 어허 어 얼야어 어어어 얼도리 에양 사대로구나”라는 유사 구음이 반복되고 있다. 본사(本辭)보다는 여음을 반복하는 형태로 전개되는 것이 특징이다.
구(舊)북제주군 애월읍은 밭농사를 많이 지었고, 그에 따라 김매는 작업도 많아서 김매는 노동에 수반되는 민요가 다양하게 발달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자진사대 소리」 외에도 이 지역에서 주로 불리는 진사대소리는 이러한 생활 환경이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진사대소리를 제대로 부를 줄 아는 소리꾼이 극히 제한적이나, 제주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서 체계적인 전수가 기대된다. 2005년 10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로 재지정되었다.
제주 지역에서 불리는 부요 중에 긴 호흡으로 부르는 몇 안 되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 민요이다. 특히 제주도 창법의 특징 중 하나인 청성과 세요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민요여서, 제주적인 음악 양식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조영배, 『제주도 노동요 연구』(도서출판 예솔, 1992)
- 조영배, 『제주도 무형문화재 음악연구』(도서출판 디딤돌, 1995)
- 조영배, 『북제주군 민요 채보 연구』(도서출판 예솔,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