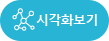| 항목 ID | GC40081709 |
|---|---|
| 한자 | 喪輿 - |
| 영어공식명칭 | a funeral song |
| 이칭/별칭 | 「상엿소리」 |
| 분야 | 구비 전승·언어·문학/구비 전승,문화유산/무형 유산 |
| 유형 | 작품/민요와 무가 |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묘리 |
| 시대 | 현대/현대 |
| 집필자 | 권현주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묘리에서 상여를 메고 갈 때 부르는 의식요.
「상여 앞소리」는 장례 절차 중에서 장지(葬地)까지 상여를 메고 갈 때 상두꾼이 메기는 사설을 일컫는 장례 의식요이다. 이를 「상엿소리」라고도 한다.
1981년 달성군에서 간행한 『내 고장 전통 가꾸기』에 실려 있다. 이는 1981년 달성군 하빈면 묘리에서 정수달[남, 당시 56세]로부터 채록한 것이다.
「상여 앞소리」는 네 마디의 형식을 기본으로 한다. 특히 조흥구의 반복이 많은 「상여 앞소리」는 '으흥으흥 어하넘차 으흥흥'의 구절을 시작으로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 서술한다. 이 외에 '병풍에다 걸린 닭이 홰를 치면 돌아오나', '큰 솥에 안친 쌀이 싹이 트면 오실런가' 등의 사설을 통해 한 번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올 수 없음을 보여 주기도 한다.
으흥으흥 어하넘차 으흥흥/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어하넘차 으흥흥/ [중략] 병풍에다 걸린 닭이 어하넘차 으흥흥/ 으흥으흥 어하넘차 으흥흥/ 홰를 치면 돌아오나 어하넘차 으흥흥/ [중략] 뒷동산에 고목나무 어하넘차 으흥흥/ 으흥으흥 어하넘차 으흥흥/ 꽃이 피면 오실런가 어하넘차 으흥흥/ [중략] 뛰잔듸기 옷을 삼고 어하넘차 으흥흥/ 으흥으흥 어하넘차 으흥흥/ 솔이 솔을 벗을 삼자 어하넘차 으흥흥/ 으흥으흥 어하넘차 으흥흥
「상여 앞소리」는 상여를 옮기면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망인을 기억하며 감성을 자극하기도 하지만, 상여꾼들의 발을 맞추어 이동하기 쉽게 박자를 맞추는 역할도 한다.
최근에는 화장(火葬)을 선호하는 등 장례 의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게다가 운구차로 장지까지 직접 주검을 운반하는 까닭에 상여꾼이 상여를 메고 부르던 「상여 앞소리」의 전승도 점차 사라져 가는 추세이다.
전국에서 불렸던 「상여 앞소리」는 대개 이승에 대한 미련과 인생무상을 노래하고 후손들에 대한 당부,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등 망자를 떠나보내는 보편적인 내용이 노랫말을 이루고 있다. 「상여 앞소리」는 시신을 상여 위에 싣고 묘소까지 운구할 때, 망자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조흥구에서부터 인생의 허무함을 담는 등 장례 의식요의 면모를 잘 보여 주고 있다.
- 『내 고장 전통 가꾸기』 (달성군, 1981)
- 『대구의 뿌리 달성』 1-달성을 되짚다(달성문화재단·달성군지간행위원회, 2014)